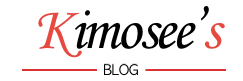사람들은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음.
어떤 것이냐면 “고대 시절에도 신전들은 자선을 하고 고아와 과부들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고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해왔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대중화되있으면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신전이 고아들을 키워주고 복지를 담당해서 제우스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내무위키 썰도 있을정도지.
근데 역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기독교 이전의 고대의 신전들의 자선행위를 부정함.
정확히는 “자선” 그 자체를 부정하는거지
아주 저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 전공자이자 한국 고딩 교과서에도 실린 공동체주의 대빵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현대적 계승자인 매킨타이어 할배가 그의 저서 “덕의 상실”에서 고대 그리스의 상황을 이렇게 서술함
“There is no word in the Greek of Aristotle’s age correctly translated ‘sin’, ‘repentance’ or ‘charity’.”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원죄”나 “회개” “자선”으로 정확하게 번역할수 있는 단어는 없다)
매킨타이어의 설명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선 그러니 쉽게 말해서 “기부”란 단어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
여기서 자선이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예를 들어서 노예나 이방인 아니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으며 그저 불쌍함 때문에 자신의 돈이나 자원을 주는것” 임.
국가가 시민권자들한테 배푸는 복지나 친구가 친구를 도와주는 자선이 없다는것은 아니고 정확한 의미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행하는 자선을 뜻함.
충격적이지?
심지어 매킨타이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자선의 존재를 믿는것은 마치 유니콘의 존재를 믿는것과 다를게 없다고 비웃음.
왜냐하면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자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기에 자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무지에의 호소에 의존하기 때문이지.
고대 그리스 사원들은 기본적으로 “축제”를 위해서 있었지 자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음.
쉽게 생각하셈.
고대 그리스 신전들은 쉽게 말해서 한국 무당집의 확대 버전임 비슷한 민간신앙이지.
근데 무당들이 굿하고 나서 자선 홍보한적 있긴 하냐?
아에 의도조차 없을껄?
그리고 이것은 매킨타이어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님.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제를 높이 평가했고, 이것을 초대교회가 물려받아, 로마 세계 전역에서도 유명해질 정도로 가난한 이들에게 후히 베풀었다.이교도 황제 율리아누스Julian(주후 4세기)는, 가난한 이들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베푸는 일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황제는 이에 대응하여 갈라디아지방에서 사역하던 이교도 사제 아르사키우스Arsacius에게 편지를 보냈다.그 편지는 아르사키우스에게 ‘나그네들에게 베푸는 자선’ 덕분에 기독교 운동이 얼마나 진전했는지 주목하라는 말로 시작했다.율리아누스는 이렇게 썼다.
“내 생각에, 우린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러한 덕목을 하나하나 실천해야 하오.또 그대만 실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소.
갈라디아에 있는 사제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해야 하오.” 기독교인들이 하듯이 하라는 이러한 권고는 율리아누스에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율리아누스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이들에게는 가혹한 조치가 기다리고 있었다.“부끄럽게 만들거나 설득해서 의를 행하게 하시오.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박탈하시오.”
율리아누스는 구체적이기까지 했다.모든 도시에 쉼터를 지으라고 명하고 황제의 금고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주었다.
“매년 갈라디아지방 전체에 옥수수 3만 포대와 포도주 6만 병을 보내시오.명하건대, 그 중 1/5은 사제들의 시중을 드는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나그네와 거지들에게 나누어 주시오.” 황제는 왜 이러한 시도에 이토록 열의를 보였을까? 율리아누스가 바로 설명했다.
“이 상황이 수치스럽기 때문이오.유대인들은 아무도 구걸할 필요가 없고, 또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황제가 기독교인을 지칭하는 용어]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들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난한 이들도 도와주어, 우리 민족이 우리에게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되니 말이오.”
황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일이 현대의 독자들에는 놀라울지 모른다.
로마 사회는 불우한 이들을 돌보는 일에 완전히 귀를 막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이 황제의 문제는, 그리스-로마 문화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먹여살리는 일이 국가가 담당할 의무였다는 것이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이 종교적 의무였다.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가 언급하듯이, 이교 신전을 배급소로 바꾸려 한 율리아누스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율리아누스가] 이교도 사제들에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듯 하라고 권했지만, 거의 혹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기반으로 삼을 교리적 바탕이나 전통 관습이 없었기 때문이다.로마인들이 자선을 하나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바탕에 자선이 없었다.이교도 신들은 윤리적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동을 벌하지 않았다.신을 화나게 하는 경우는, 인간이 종교 의식의 규범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때뿐이었다.그러나 로마의 종교와는 반대로,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일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지였다.”
『죄의 역사』게리 A.앤더슨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고대 로마인들은 국가 복지나 친구들간의 도움을 안한게 아니라
“자기하고 연고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그네나 이방인들까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주는”
순수한 의미의 자선이 없던거임 다시한번 강조함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교 사제들은 “테헤엥 황제상 자선이 뭐인데스? 세레브한 올림프스 사제들은 그런거 모르는 데챳 그런건 더러운 황제상이 하는데스 쿠쿠쿠” 정도의 반응을 보인거임.
과장했지만 그들은 자선을 아예 몰랐음.
무당들한테 자선 콘서트 열라고 한거니 당연한거지.
실제로 기독교 전파의 핵심이 자선 때문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있음.
그래서 황제님이 개빡쳤지만 어쩌겠냐?
무당들한테 너무 많은걸 바란거지.
더 많은걸 알고 싶으면 영어 위키백과 ㄱㄱ.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로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배푸는것이 그들을 더욱더 악성에 물들게(아마도 게으름)할것이라고 믿었으며 거의 모든 자선은 사실상 정치적 매수(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고 추종자를 끌어모으기 위한)였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것에 대한 불안이었음.
쉽게 말해서 “에휴 거지 새끼들 이거 먹고 바닥에 기어 ㅅㅅ”이런거.
일부 지식인들이 자선을 옹호하긴 했지만 그어떤 시점에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자선이 옹호된적은 없었음.
쉽게 말해서 이런 마인드가 주류였음
“In Greco-Roman culture, the well-to-do weren’t expected to support and help the poor.The Greek and Latin verbs for ‘doing good, being beneficent’ never have ‘the poor’ as their ob ject, nor do they mean ‘almsgiving’.The Greek word philanthrôpia doesn’t have the sense of our modern philanthropy.
One is philanthrôpos towards one’s own people, family, and guests – not towards the poor.And eleêmosynê (from which ‘alms’ is derived), in the sense of showing pity or mercy for someone else, never has the poor as its primary ob ject.Ancient Greek moralists didn’t admonish people to concern themselves about the fate of the poor.And while generosity was praised as a virtue, the poor were never singled out as its ob ject; it was always directed to humans in general, provided that they deserved it.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울 것으로 기대되지 않았습니다.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선을 행하다, 은혜를 입다’라는 동사는 ‘가난한 자’를 목적어로 한 적이 없으며, ‘시혜를 베푸다’라는 뜻도 아닙니다.그리스어로 ‘philanthrôpia ‘라는 단어는 우리의 현대 자선 활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philanthrôpos 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 가족, 손님들을 향한 자선입니다.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자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엘레모신시(‘아몬드’가 유래됨)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도덕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 걱정하라고 사람들에게 충고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관대함은 미덕으로 칭송받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그것의 목적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그들이 그것은 항상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에게 향했습니다.
When Greeks did speak about the joy of giving to others, it has nothing to do with altruism, but only with the desired effects of giving: namely honour, prestige, fame, status.Honour is the driving motive behind Greek beneficence, and for that reason the Greek word philotimia (literally, ‘the love of honour’) could develop the meaning of ‘generosity, beneficence’, not directed towards the poor but to fellow humans in general, especially those from whom one could reasonably expect a gift in return.
These were the ‘worthy ones’ because they acknowledged and respecte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quid pro quo), one of the pillars of ancient social life, which was simply stated by the poet Hesiod around 700 BCE: ‘Give to him who gives, but do not give to him who does not give (in return).’ Even though some ancient moralists occasionally said that in the best form of beneficence one does not expect anything in return from the beneficiary, the pervasive view was that a donor should be reimbursed one way or another, preferably with a gift greater than the donor himself had given.
그리스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에 대해 말했을 때, 그것은 이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주는 것의 원하는 효과, 즉 명예, 위신, 명성,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명예는 그리스인들이 은혜를 베푸는 원동력이며, 그러한 이유로 그리스어 필로티미아(문자 그대로 ‘명예에 대한 사랑’)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료 인간들, 특히 그 대가로 합리적으로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움, 은혜’의 의미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기원전 700년경 시인 헤시오도스가 간단히 말한 고대 사회생활의 한 축인 호혜성(quid proquo)의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비록 몇몇 고대 도덕가들이 때때로 최고의 형태의 수혜자로부터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보편적인 견해는 기부자가 어떤 식으로든, 가급적이면 기부자 자신이 준 것보다 더 큰 선물로 상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Religion was not much help to the poor: they simply weren’t the favourites of the gods.There was a Zeus Xenios (for strangers) and a Zeus Hiketêsios (for supplicants), but there was no Zeus Ptôchios (for the poor), nor any other god with an epithet indicating concern for the needy.
It was rather the rich who were seen as the favourites of the divine world, their wealth being the visible proof of that favour.The poor could not pray for help from the gods because they were poor, for their poverty was a disadvantage in their contact with the gods.
This was the implication of the common belief that the poor were morally inferior to the rich.They were often regarded as more readily inclined to do evil; for that reason, their poverty was commonly seen as their own fault.No wonder that they were not seen as people deserving help, and that no organised charity developed in Ancient Greece or Rome.In such societies, giving alms to the poor could not be seen as a virtue, as care for them was often regarded as a mere waste of resources.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그들은 단순히 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제우스 크세니오스(낯선 사람들을 위한)와 제우스 히케테시오스(구원자들을 위한)는 있었지만, 제우스 프토키오스(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는 없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관심을 나타내는 다른 신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들이 신의 세계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보였고, 그들의 부는 그러한 호의의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난은 신들과의 접촉에서 불리했기 때문입니다.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는 일반적인 믿음의 의미였습니다.그들은 종종 악을 저지르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그 이유로, 그들의 가난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보이지 않고,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조직된 자선 단체가 발전하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종종 자원의 낭비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주는 것은 미덕으로 여겨질 수 없었습니다.
The distributions of corn to the population by city states or emperors in times of need cannot pass for organised charity because the corn was given to all citizens in equal measure (not only to the poor).The poor didn’t get more than the rich, and even the poorest class of society was never singled out for especially favourable treatment.All this applies to the Ancient Romans no less than to the Greeks.When a Roman is generous towards others, it is not because they are poor but because he expects to get something in return, and because it confers honour and status upon him.Beneficia are for fellow citizens, not for the poor.
도시 국가나 황제가 필요할 때 주민들에게 밀을 배급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조직적인 자선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고, 심지어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도 특별히 호의적인 대우로 뽑힌 적이 없었습니다.이 모든 것은 그리스인 못지 않게 고대 로마인들에게도 적용됩니다.로마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할 때, 그것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그에게 명예와 지위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수혜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Since the beneficiary was usually expected to give something in return, the benefaction could become a burden.‘There are some who even hate their benefactors,’ said Menander the playwright.But the idea of reciprocity was deeply ingrained in ancient society, and giving remained one of the chief ways of acquiring status within the social or political group.Neither Ancient Greek nor Roman shrank from admitting that striving after honour was the decisive motive for generosity.The Roman philosopher and orator Cicero wrote that ‘most people are generous in their gifts not so much by natural inclination as by the lure of honour’.And Pliny the Younger pithily agreed: ‘Honour must be the consequence’ of generosity.”
수혜자는 통상 대가로 뭔가를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혜택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극작가 메난더는 ‘그들의 후원자를 증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호주의의 생각은 고대 사회에 깊이 배어 있었고, 주는 것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집단 내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관대함의 결정적인 동기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로마의 철학자이자 웅변가인 키케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재능에 관대하다’고 썼다.그리고 어린 플리니우스는 ‘명예로움은 관대함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에 간결하게 동의했습니다.
Pieter van der Horst
그는 신약 연구, 초기 기독교 문학, 초기 기독교의 유대인과 헬레니즘적 맥락을 전문으로 하는 학자입니다.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 신학부 명예교수로 고대유대교와 초기기독교 연구(2014) 등 많은 책의 저자이다.
https://aeon.co/essays/the-poor-might-have-always-been-with-us-but-charity-has-not
(많은 부자들은 노숙자, 특히 구걸하는 사람들에 대해 동정심이 거의 없었습니다.키케로는 그들을 “식민지로 배수”할 자격이 있는 “도시의 쓰레기” 인 dordem urbis et faecem 으로 묘사했습니다.그러나 노숙자들은 도로와 큰 건물을 건설하고 꽉 찬 평민을 요구하는 자존심을 가진 주요 정치인의 군중을 채우기 위해 일용 노동자로 필요했습니다.
검투사 경기를 위해 야생 동물을 다루는 일을 도운 일부는 로마의 콜로세움 근처 술집에서 상처를 드러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노숙자들은 어디에나 있었고 부유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사악하다고 여겼습니다.필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형벌은 가혹했습니다.로마인들은 기원전 71년에 6천 명의 스파르타쿠스 반란군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들을 주요 고속도로인 아피아 가도에 남겨두고 고통과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었습니다.관리들은 독수리의 즐거움과 노예 교육을 위해 시체를 거기에 매달아 두었습니다.노예의 주인은 반란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보기 위해 현장 여행에 데려 갈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 했음 근데 키케로 개자식)
출처
(이시절 로마인들은 자선을 배풀면 거지들이 더 타락할거고 거지인 이유가 노오력이 부족해서라고 믿었음)
아 참고로 이거 전부다 “로마 시민”일때 한정임.
로마 시민 아니면 국물도 없음.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돈없어서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거나 극장이나 서커스 아래에서 살아야되고 목욕탕 가는것도 금지였음.
그래서 이런분들이 대깨황 되어서 로마 황제님들 빠돌이 하고 사셨음.
아 맞디 추가로 저기 위의 노오력충들이 매일매일 너가 거지라는 이유로 비아냥거리고 노오력하라는 드립하는 거 듣고 살아야 함.
(로마빠들도 노오력충 로마에 살고 싶지는 않을거임 ㅠㅠ) 그러나 영어위키 백과에 따르면 기독교 공인이후 더이상 빈민들은 노오력~~드립에 시달리지 않게되었고 더이상 강제로(말을 안했는데 기부행위를 할때 요구된것은 사실상 반강제적인 지지였음 에를 들어서 투표할때 나 뽑거나 지지선언 해주거나 등등의 사소한 정치적 지원들)윗분들에게 “보답”하지 않아도 됨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공경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헐벗은 것을 볼 때 못 본체하지 마십시오.바깥 거리에서 추위와 헐벗음으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돌보지 않는 동안에는 이곳(성당)에서 비단옷으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지 마십시오.’이것은 내 몸이다'[9]라고 말씀하신 분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과 같은 분입니다.
제대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비단으로 된 제대보가 아닌 깨끗한 마음을 필요로 하시며, 거리에 있는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금잔들이 즐비하지만 그분 자신이 굶어 죽으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먼저 배고픈 이를 먹여 주고 난 다음 그 나머지로 식탁을 장식하십시오.여러분은 금잔을 만들게 하면서 배고픈 이에게 물 한 잔을 주지 않습니다.이로써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대를 금으로 된 제대보로 꾸미면서 헐벗은 이에게 필요한 옷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그네로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을 보거든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그러나 여러분은 나그네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당의 바닥과 벽과 온 기둥을 장식합니다.등경에다 은으로 된 사슬을 매달면서 감옥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그분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성당을 이런 물건들로 장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물과 함께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다만 여러분이 예물을 바치기 전에 가난한 이들을 먼저 도와주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성당을 장식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지게 되고 악마들과 함께 고초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성당을 장식할 때 고통 받는 형제를 못 본체하지 마십시오.그는 돌로 된 다른 성당보다 훨씬 가치 있는 성전입니다.”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사이다 설교) 제발 같은 똥수저면 예수 믿읍시당!!
세줄 요약
1.기독교 이전 로마는
2.똥수저들의
3.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