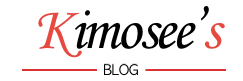밀리터리 차이나 [윤석준의 차·밀]中군사굴기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어디? 차이나랩 ・ 2018. 11. 23. 11:15 중국이 군사굴기를 이렇게 빨리 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경제적 성장을 지향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막대한 국방비가 투입되는 군사굴기를 추진하여 손해볼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군사굴기를 경제 발전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군사굴기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득권 회복과 더 나아가 세계 전략에 대한 영향력 증대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꿈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
밀리터리 차이나 [윤석준의 차·밀]中군사굴기로 가장 이득을 본 나라는 어디? 차이나랩 ・ 2018. 11. 23. 11:15 중국이 군사굴기를 이렇게 빨리 하리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경제적 성장을 지향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막대한 국방비가 투입되는 군사굴기를 추진하여 손해볼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군사굴기를 경제 발전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은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군사굴기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역사적 기득권 회복과 더 나아가 세계 전략에 대한 영향력 증대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중국꿈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를 보는 중국 인접국과 주요 국가들의 시각은 “ 중국 군사굴기에 대응하여 더욱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강구해야 한다 ” 는 주요 국가들의 거부감과 중국의 “ 군사굴기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생존을 지향해야 한다 ” 는 숙명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전자가 유럽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및 인도 등이면 , 후자는 아세안과 일부 서남아시아 국가일 것이다 .
첫째 , 유럽이다 . 유럽은 지리적으로 중국 주변지역은 아니나 , 중국이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에 의해 유럽이 아시아와 해 · 육상으로 연결된다고 하여 엉뚱하게도 중국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었다 .
[출처:셔터스톡] 유럽의 중국 군사굴기 대응은 나토 (NATO) 가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
하지만 대부분의 관심을 러시아에 집중하고 있으며 ,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 국방연구원 (RUSI) 그리고 제인연구소 (Jane’s Defence Institute), 프랑스 국방연구원 (IRSEM),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원 (SWP), 스웨덴 스톡홀롬 국제평화연구원 (SIPRI), 노르웨이 국방연구원 (IDS) 등이 중국 군사굴기의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대부분 나토군 구도 내에서의 중국과의 군사협력과 신뢰구축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 유독 캐나다만이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지정학적 연계성에 의해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연구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 동부에 위치한 대학 , 연구기관 보다 서부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남중국해의 군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과 함께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예를 들면 브리티쉬 콜롬비아 대학교 (UBC), 알버타 대학교 중국연구소 , 캐나다 해군 서부지역사령부의 국제문제 동향 연구소 (RCN Outlook) 등이다 .
당시 캐나다 벤쿠버에 위치한 정체 모를 칸화 (Kwanhwa) 연구소가 중국 군사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 현재 칸화연구소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둘째 , 호주이다 .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호주의 연구는 정권이 중국과의 협력을 지향하는 경우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나 , 이러지 않은 경우는 중국 군사력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연구성향을 보인다 . 하지만 최근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호주의 영향권인 남태평양과 호주 국내 정치 영향으로 나타나며 , 중국 해군력의 작전범위가 호주의 서부 해양인 인도양으로 확대되자 , 미국 , 일본 , 인도와의 해양협력을 지향하며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 특히 호주국립대학교 (ANU), 통합국방사관학교 (ADFA), 아시아 안보 및 태평양 연구소 (ASPI), 로위연구소 (Lowy Institute) 그리고 호주 국제관계 연구소 (AIIA)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도 – 태평양에서의 중국의 군사굴기를 지역내 주요 국가와 협력하에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범위에 그치고 있는바 ,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구도를 가능한 피하는 성향이다 .
셋째 , 일본이다 .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연합작전 체제를 맞추면서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을 취하는 모양세였으나 , 이제는 일본 독자적 대응 방책을 마련 중이며 중국 군사굴기를 각 분쟁 별로 독자적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 주된 연구 분야가 중국군 작전과 전술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 연구결과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고 있다 , 현재까지 일본 방위성의 『 방위백서 (White Paper) 』 와 국가방위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가 The Japan Times 에 의해 매년 발간하는 『 동아시아 전략 평가서 (East Asia Strategic Review) 』 가 유일한 공개본이다 .
특히 일본의 중국 군사굴기 평가에 있어 과거와 달리 중국의 ‘ 눈치 ’ 를 전혀 보지 않으며 , 이를 미국 , 호주 , 인도 그리고 아세안과의 협력에 의한 공동 군사대응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 이에 따라 그동안의 중국군에 대한 개념 위주의 학제적 연구 성향에서 벗어나 , 작전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비밀정보 생산 위주의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 이는 극단적인 보수적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시진핑 중국 강군꿈 ( 强軍夢 ) 선언과 트럼프의 강경대응 선언 이후 그동안 주로 중국군의 주요 구조와 제원 , 능력에 집중하던 방위성 방위연구원 , 방위대학교 , 민간 대학 안보연구소들이 일제히 중국 군사력 현대화 결과에 따른 전력 배치 , 운용 그리고 일본에 대한 위협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 특히 중국 군사굴기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공동대응 및 독자적 대 ( 對 ) 중국 군사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 작전 시나리오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 이는 지금까지 중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적 접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던 성향에서 대 ( 對 ) 중국 강경론 성향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최근엔 각종 안보 관련 보수 인사 주도의 재단법인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
예를 들면 , 2017 년 7 월에 설립된 『 Asia Pacific Initiative 』 재단법인이다 . API 는 2011 년 9 월에 설립된 Rebuild Japan Initiative Foundation (RJIF) 재단이 API 로 전환되어 미일 안보동맹 강화를 대 ( 對 ) 중국 견제로 변화시키기 위한 리더그룹 간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 여기에는 대 ( 對 ) 중국 강경론자들이 포진되어 있다 .
예를 들면 커트 캠펠과 마이클 그린 등이며 , 일본 자위대 예비역 지상군과 해 · 공군 장성들이 선임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그동안 중국에 대해 균형적 접근을 하던 『 일본해양정책연구소 (OPRF) 』 가 극보수의 사사카와 (Sasakawa) 재단과 합병되어 북한과 중국 간 군사협력에 대비하는 한미일 군사대응 시나리오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 현재 미국 사사카와 재단 이사장은 전 ( 前 ) 태평양 사령관이자 국가정보국 국장을 역임한 데니스 블레어 해군대장 ( 예 ) 이며 , 그는 일본의 대 ( 對 ) 중국 강경론을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있다 .
특히 이들 연구소의 중국 군사굴기 관련 연구 내용들이 과거와 달리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심지어 연구위원들이 국외 세미나에 참가해서도 발표 자료를 공유하지 않는 수준이다 . 아마도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있어 공개를 주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 해군기동단은 인도양에서 미국 및 인도 해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 미 해군 함정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FONOP) 를 실시하였다 .
[출처:셔터스톡] 특히 일본식 해병대 기능을 발전시켜 도서 탈환을 위한 상륙작전 전력을 건설하여 오키나와 및 센카쿠 열도 근해에 배치하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FONOP 에 대해 소극적이었고 학자와 전문가들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으나 , 지금은 적극적이다 . 최근 미 · 일 간 ‘Keen Sword 연합훈련 ’ 을 최대 규모로 실시하였으며 , 캐나다 해군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
넷째 , 아세안이다 . 중국의 군사굴기를 대부분 숙명적으로 받아 들이는 입장이며 , “ 안보는 안보 , 무역은 무역 ” 이라는 이중적 입장을 보인다 . 인도네시아 CSIS 와 말레이시아 MIMA(Malaysia Institute for Maritime Affairs) 와 ISIS(Institute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필리핀 PACS(Philippine Association for Chinese Studies), 싱가포르 RSIS(S. Rajanatna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와 IDAS(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Studies), 태국의 Chulalonkom 대학 , 베트남 국방부 예하 방위 및 국제관계 연구소 (IDII: Institute for Def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와 국방전략연구소 (Institute for Defense Strategy; IDS),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DAV: Diplomat of Academy of Vietnam), 미얀마 타난가연구소 (Thayninga Institute) 등에서 주도하고 있다 .
하지만 아세안 각국이 중국 군사굴기에 접근하는 전략은 각기 다르다 . 베트남은 주로 중국과의 남중국해에서 해양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에 치중하다가 중국의 남사군도 인공섬 건설과 군사화 조치등의 군사굴기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 대부분의 연구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 이는 베트남 정부가 여전히 친 ( 親 ) 중국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 가능한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되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인식된다 . 현재 베트남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대폭 증진시키고 있다 .
필리핀은 2016 년 7 월 12 일에 PCA 로부터 우호적인 판결을 받은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절대적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면서 스카르보로 쏘울 (Scarborough Shoal) 과 하프문 산호초에서 중국 해군력과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 . 하지만 우세한 중국 해군력을 자극하여 직접적 대결국면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소극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
지난 8 월 30 일 필리핀 구축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하프문 산호초에 좌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에 필리핀 정부가 분쟁 해역에 전개된 중국 해군을 우호적으로 배려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 것이 대표적 사례였다 .
[출처:신화망] 아울러 11 월 23 일에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필리핀 방문시에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과 중국 간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의 ‘ 공동개발 합의서 (Joint Development Framework)’ 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내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 특히 공동개발 합의서 서명에 대해 필리핀 내 전문가들은 공동개발에 따른 경제지원도 중요하지만 , 반대로 필리핀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주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 그동안 필리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석유 및 가스 시추사업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중국의 인도양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부상시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우발사태 방지 등을 위한 싱가포르의 중재자 역할 모색에 중점을 두며 대부분 연구방향을 태평양과 인도양 간 연계성 (connectivity) 에 두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 그 외 마얀마 ,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의 군사굴기보다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따른 중국 경제적 위협을 더욱 우려하나 , 중국과 맞서기 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 자국의 경제적 실리를 챙기는 이중적 모습으로서 이들 국가의 중국 군사굴기 연구 대부분은 자국 변경 문제와 연계된 갈등에 집중하고 있다 .
[출처:셔터스톡] 다섯째 , 인도이다 .
우선 그동안 인도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연구소가 없었다 . 이는 대부분 연구가 파키스탄 , 스리랑카 그리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해 집중되었고 , 중국과의 문제는 카슈미르 국경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며 , 카슈미르 국경분쟁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었다 .
그러나 1990 대 말부터 중국 해군이 인도양에 진출하고 2013 년부터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에 의해 파키스탄과의 군사협력에 추가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 스리랑카에 항만 건설을 하여 ‘ 부채의 늪 ’ 에 빠지도록 하여 함반타토 항구를 99 년간 장기임대하자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여 이를 일본 , 호주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에 견제하는 전략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 특히 해양안보에 관심을 두어 인도양 지역 국가 간 해양협력을 강화하는 다자간 협력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한다 .
이를 주도하는 학교 및 연구기관은 자와하랄 네루대학교 (Jawaharlal Nehru University), 국방연구원 (IDSA), 통합군연구소 (USI) 등이다 .
[출처:봉황망] 여섯째 , 대만이다 . 냉전시 대만의 중국 인민해방군 연구는 매우 잘 정리되어 있으며 , 축적된 자료량만도 대만 중앙연구원 , 대만 국방부 정치총국 , 정치작전학교 , 대만 안전국 , 대만 경비총사령부 , 대륙연구소 등이 경쟁적으로 중국군 인사 , 조직 , 파별 구조 , 전술 , 정치작전 개념 등의 분야에 대한 방대한 수준이었으며 , 이들 대부분이 서방 중국 전문가들의 중국군 연구에 있어 크게 기여하였다 .
그러나 , 중국이 개방 ·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의 각종 자료가 미 국무부 해외정보체계 (FBIS) 와 영국 BBC 방송의 세계요약 (BBC World Summary) 등에 의해 거의 매일 영문자료로 발간되고 미국 등 서방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어를 배워 대륙과 직접 접촉하며 독자적 중국군 연구를 시작하자 , 대만의 중국연구 자료들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
특히 대만의 중국군 연구 방법에 정치적 성향이 개입되고 정보출처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단점을 노출시키자 , 대만 연구자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 . 예를 들면 대륙연구 ( 大陸硏究 ), 공비연구 ( 共匪硏究 ), 중공연구 ( 中共硏究 ) 등의 중문 저널들이 서방 전문가들의 연구논문에 인용되지 않는 이유와 금년 초 미국 Free Beacon 연구소가 대만 정부로부터 입수하여 공개하였다는 중국 공산당 내부문건 사건이 ‘ 가짜 ’ 로 알려지면서 더욱 신뢰성이 저하되었다 .
특히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TPP) 이 집권하고 국민당의 기조가 대륙과의 경제협력으로 변화되자 , 대규모 인력과 조직을 자랑하던 대만의 중국군 연구는 퇴색하여 현재 대만 국방대학교 산하 전략 / 국제관계연구소 ( 戰略與國際事務硏究所 ) 와 푸싱강 ( 復興崗 ) 학원내 중공군사사무연구소 ( 中共軍事事務硏究所 ) 에서만 공식적으로 중국 군사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 대부분 중국군 주요 지휘부 인적 성향 , 계파 연구에만 집중하고 있다 .
[출처:인민망] 일부 대만 국방부가 고용한 중국 내부 정보원들이 신형 장비 및 무기체계의 사진 및 중국군 내부 문건 습득 등에 의해 서방 언론매체들의 기사를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 중국군 운용 장비 및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미국 등 서방 국가 연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그동안 대만 정부 , 국방부 , 국민당 연구기관 위주에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차원에서 민간 재단법인 연구소와 신흥 대학 내에 중국군 연구소가 증가한 것이 특색이다 .
[출처:셔터스톡] 예를 들면 중화전략연구 (SSS), 대만안전연구 ICSS), 아태안전치리연구회 CAPSGS) 와 중국중흥대학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등이다 , 이들은 홍콩 , 마카오 , 미국 , 일본 호주 등과 중국군 연구를 진행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 군사굴기에 대한 중국 주변국가의 향후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 우선 숙명론이다 .
즉 중국이 미국과의 파워게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중국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필요하게 되어 더 이상 군사굴기로 주변국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 이는 아세안 중에 미얀마 ,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서 많이 식별되는 대응책이다 . 또한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이 중국과의 남중국해 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군사협력과 군사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 여기에 일대일로까지 포함되었으니 , 아세안 입장의 군사굴기에 대한 대응은 더욱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
다음으로 주변국이 어느 정도 중국의 기득권을 인정하며 ,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 이는 베트남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군사굴기 위협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역사적 기득권을 기정 사실화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고 그 적용 대상을 호주 , 일본과 인도로 집중할 것이라는 희망적 낙관론에서 발견된다 .
[출처:셔터스톡] 특히 호주 , 일본 및 인도가 이를 우려하여 중국 군사굴기를 보는 시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미국 , 호주 , 일본 및 인도가 4 자 해양안보협력 (QUAD) 구성에 합의하는 주된 이유이다 .
아울러 외부 세력의 개입에 따른 중국 견제이다 . 중국 군사력과 비교시 너무 취약한 군사력을 보유한 중국 주변국은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중국 군사굴기에 대응할 수 없으니 ,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이 개입해 중국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이다 . 이는 미국 , 영국 , 프랑스 , 호주 및 일본의 남중국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작전 (FONOP) 실시에 대해 중국 주변국들이 비교적 긍정적 시각을 보내는 주된 이유이며 , 이를 통해 중국에게 보다 구체적 경고를 보내 교훈을 주기를 바라는 기대이다 .
[출처:인민망] 또한 중국과 미국이 아닌 , 러시아와 협력 증진으로 통한 최소한의 견제이다 . 중국의 군사굴기로 가장 이득을 본 국가가 러시아이다 .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이 러시아의 첨단 장비와 무기체계 도입에 적극적이며 , 이를 통해 러시아를 모방한 중국군의 장비와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 아울러 중국군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전술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이유를 갖고 있다 .
이는 베트남이 러시아 킬로 (Kilo) 급 잠수함 6 척을 도입한 주된 이유이다 .
[출처:셔터스톡] 더욱이 중국의 군사굴기를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기보다 ,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내기 위한 전략적 레버리지 차원으로 보아 “ 언젠가는 군사적 위협 보다는 경제 · 문화적 융합과 협력으로 변화하겠지 ” 하는 체념이다 . 하지만 불행히도 지난 5 년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접한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의 경제 · 문화적 우월성을 수용하는 것이 과거와 달리 신제국주의 (new imperialism) 적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더욱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
마지막으로 중국 군사굴기를 수용하여 생존하는 숙명론 , 중국이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릴 것이라는 낙관론 , 누군가 도울 줄 것이라는 기대론 그리고 중국군의 취약점을 확인하여 견제론 그리고 군사적 위협을 경제문화적 협력으로 대신하려는 체념론 중 어느 것이 먼저 도래할지는 오직 “ 중국 ” 만이 알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
글=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차이나랩.